많은 시민들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하 국가)이 사회 전체의 부를 지키고 늘려주며, 나의 안전과 이익을 지켜주리라는 막연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가 이러한 믿음에 반하는 정책을 종종 취해왔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공공 목적의 사업을 한다며 시민의 사유재산인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등의 사례들 처럼 말이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어온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막연히 느끼고 있으며, 그 대상이 자신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는 한다.추상적인 존재로서의 국가가 사회와 시민 개개인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회를 존재할 수 있게 하는 대전제다. 하지만 특히 한국이라는 국가는 주변의 적국들로부터 국가의 존속을 지킨다는 존재 목적을 우선시했으며, 시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것은 제1순위 목적이 아니었다. 심지어 국가의 존속을 지킨다는 목적으로 시민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목숨까지 빼앗는 일도 숱하게 일어났다. 1980년 5월 18일에 광주에서 있었던 국가 폭력은 그 중 가장 심각한 사례로 꼽힌다.나아가, 국가 또한 개개인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집합체이다 보니, 국가를 구성하는 조직원 개개인의 판단과 이해관계를 우선시해 조직 바깥에 존재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일어났다. 특정 공무원들이 자신의 임기 중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순환배치돼 다른 보직으로 간 뒤에는 모른 척 하는 경우를,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상대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봤을 터다.이처럼 국가에 의해 사회와 시민 개개인이 피해를 입는 구조가 100여 년간 이어지다 보니, 시민들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이다. 이로 인해 국가가 선의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까지도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추진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나 언론에서는 시민들의 이러한 행동을 ‘민원’이라 부르며 비판한다. 하지만 지난 100여 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상황을 돌이켜보건대, 이 악순환의 시작은 시민이 아닌 국가(조선왕조·조선총독부·한국정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이 글에서는 국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행정 실패’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과거의 몇몇 행정 실패 사례를 되짚어봄으로써, 앞으로 행정 실패를 줄일 수 있는 힌트를 독자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다.‘시민 이주’는 가장 최악의 행정 실패다가장 심각한 행정 실패 사례는,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택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 시민들을 이주시키는 경우다.극단적인 경우로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의 시민들이 겪은 세 번의 강제 이주를 들 수 있다. 이들은 1942년에 일본군이 비행장을 건설할 때 한 번, 1952년 미군이 이곳에 주둔할 때 두 번째, 그리고 한국 내의 미군 재배치 사업이 이루어진 2006년에 세 번째로 강제이주를 당했다.이 경우는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정부, 그리고 한국 정부까지 얽혀 수 십년에 걸쳐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극단적인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만 책임을 돌리기는 막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하는 두 가지 사례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경우다.2023년, 대규모 삼성전자 공단이 있는 평택의 남쪽 지역인 지제동에 미니신도시를 개발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에 살던 주민들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었는데, 이들 주민 가운데는 앞서 소개한 미군 기지 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2004년부터 시작된 고덕신도시 조성 사업 때 토지를 수용당해 이곳에 옮겨와 살게 된 경우가 있었다.아직 고덕신도시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정부는 이렇게 두 번의 이주를 강제당하는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행정을 취할 수도 있었다.
1970년대 초 울산에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질 때,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은 이웃 마을로 이주했다. 그런데 2001년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정해지면서, 그 마을이 또 다시 사업 대상 부지로 정해졌다. 정부가 원전 건설을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었지만, 처음부터 원전 건설 부지를 넓게 설정했다면 이렇게 시민들이 두 번 이주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평택 고덕·지제 신도시나 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례는 명백한 한국 정부의 행정 실패 사례다.두 번째로 살펴볼 행정 실패 사례는, 정치·행정 내부 논리로부터 비롯되는 낭비다. 특정 정치인·행정가가 사업을 추진했다가, 선거나 인사 발령을 통해 사람이 바뀌고 나면 앞선 사람이 추진했던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다.전라남도 장성군에서는 민선 6~7기 군수가 지역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통일한다는 명목으로 공무원들에게 주택 색깔의 변경을 주장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 판단을 받았다. 이후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도시브랜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네이밍을 선정했다가 무산된 상황이다. 충청북도 증평군에서도 전임 군수가 내세웠던 ‘증가포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현재는 듣기 어렵다. 싱가포르 같은 강소도시가 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괜찮은 캐치프레이즈였어서 아쉬움이 든다.이화동 벽화를 주민들이 직접 지운 사연한편, 전임 지자체장이 특정 건물을 보존하기로 했다가 후임 지자체장이 이를 취소하고 철거하는 사례도 많다. 이 때는 안전진단 등급이 낮게 나왔다거나, 시민들이 주차장을 원한다는 논리가 단골로 등장한다.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역사가 오래된 단관극장인 아카데미극장 건물의 보존을 전임 시장이 추진했으나, 신임 시장이 이 정책을 변경하면서 극장 건물이 철거됐다.또 서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추진했던 종로구 창신동 재개발을 재추진하고 있다. 창신동은 도시재생사업의 모범사례로 거론되는 곳이다. 이곳은 한양성곽에 붙어있는 고지대여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투입됐는데, 현재와 같이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결과적으로 그간 투입된 세금이 헛되이 쓰인 것이 된다.
세 번째 행정 실패는 현직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이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 관광객이 더 많이 오게 만들겠다면서 다른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베끼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 지역만의 특성이 사라져버리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대학로 근처, 한양성곽 옆에 자리한 이화동에 벽화마을이 조성됐다가 사라진 경우다. 당시 낙후된 지역에 벽화를 그리면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러면 지역이 활성화된다는 논리에서 골목마다 천사 날개가 그려졌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이 아닌 외지 자본이 가게를 열어서 이익을 얻고, 외지인들이 골목 구석구석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은 사생활 침해까지 당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이 벽화를 지워버린 것이다.광주 양림동이나 부산 이송도마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돼 결국 원주민이 밀려나고 외지인이 지역을 점령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인천 배다리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외지 자본이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기존 업체들이 위기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정부 구성원들이 무책임하게 행정을 추진한 바람에, 기존 시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겪고 결국 밀려난 이런 사례들을 전국에서 쉽게 접한다.시민들, 지자체 행정 소식에 더 관심 기울여야최근에는 천사 날개 벽화에 이어 출렁다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유행이다. 몇 년 전에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방문했을 때 수도권전철 3호선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양 옆 광고판에 지자체 두 곳의 출렁다리 홍보 광고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출렁다리는 전국에 한 두 곳 지어졌을 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신기해하지, 이렇게 국내 전 지역에 대거 들어서면 더 이상 관광자원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 또 출렁다리를 만든다고 세금을 들인만큼의 관광 유발 효과가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강원도 원주의 간현관광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출렁다리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2023년 말 시점으로 누적 적자 7억원을 기록했다.특정 사업을 추진한 직후에는 반짝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는 좋은 평가를 받아 선거에서 재선되거나 좋은 보직으로 옮겨가게 된다. 하지만 그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반짝 효과가 끝나고 결과가 나쁘게 드러났을 때, 해당 관계자는 이미 그 자리에 없고 책임도 지려 하지 않는다. 또 전임자의 행정이 좋은 결과를 낳았을 경우에도, 후임자는 전임자의 사업을 이어받기보다는 이를 폐기하고 자신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행정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기 지역의 행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장기적으로 그 결과를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각자의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국가의 행정 실패를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낸 세금을 정부가 낭비하고 그 결과 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깨어있고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야 정부 구성원들이 시민을 무서워하고 시민의 눈치를 보며 행정을 펼치게 될 것이다.김시덕 도시문헌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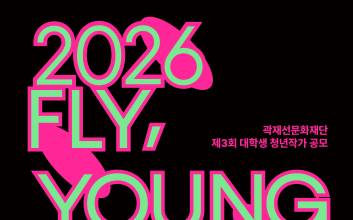

![케데헌 성지와 종묘 앞 초고층 빌딩 논란 [EDITOR’S LETTER]](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11/13/ecn20251113000016.353x220.0.jpg)
![틱톡에서 시작된 ‘맘다니’ 혁명[허태윤의 브랜드 스토리]](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11/12/ecn20251112000114.353x220.0.jpg)
![세계 1위 전자정부’의 화재, 기술보다 시스템이 타버렸다 [이근면의 시사라떼]](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11/10/ecn20251110000023.353x220.0.jpg)
![‘명품’은 왜 명품이라 불리는가 [이윤정의 언베일]](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11/10/ecn20251110000108.353x220.0.jpg)
!['너도나도 출렁다리' 만들기…행정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나 [스페셜리스트 뷰]](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11/03/ecn20251103000062.353x220.0.jpg)
!['루브르 도난사건'으로 본 그들이 '예술품'을 훔치는 이유 [백세희의 컬처&로(LAW)]](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11/10/ecn20251110000021.353x220.0.jpg)
![사법 전문가들이 쓴 최초의 가상자산 투자·사업 전략 지침서[새로 나온 책]](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11/10/ecn20251110000089.353x220.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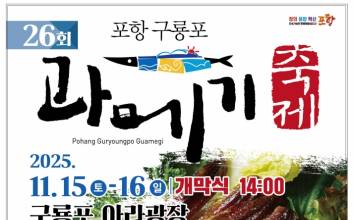
![봉화, 자연의 시간에서 도시의 다른 가능성을 보다[김현아의 시티라이프]](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11/04/ecn20251104000097.353x220.0.jpg)









![딱 1분… 숏폼 드라마계 다크호스 ‘야자캠프’를 아시나요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09/isp20251109000035.400.0.jpg)
![샤넬부터 친환경 재킷까지...지드래곤의 '화려한' 공항패션 [얼마예요]](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11/08/ecn20251108000008.400.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