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들이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률 모두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804사 중 76사(분할·합병·감사의견 비적정·금융업)를 제외한 728사의 3분기 개별(별도) 결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누적 1219조147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33조9590억원) 늘어난 수치다.영업이익은 97조60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0%(11조6844억원)나 성장했다. 순이익 역시 14.36%(13조3315억원) 증가한 106조17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영업이익률은 0.76%포인트(p) 상승한 8.01%, 순이익률은 0.88%p 높아진 8.71%를 기록했다.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은 각각 2.1%, 20.5%, 22.8% 증가했다. 이에 상장사들의 3분기 부채비율은 72.6%로, 지난해 말(76.43%)보다 3.85%p 줄었다.분석대상 728사 중 3분기(누적) 순이익 흑자기업은 582사(79.95%)로 지난해 같은 기간(595사, 81.73%)보다는 13사 감소했다. 흑자지속 기업은 532사, 흑자전환 기업은 50사로 집계됐다. 적자기업(146사) 중 적자지속은 83사, 적자전환은 63사이다.3분기 실적만 보면 2분기 대비 매출액(3.9%), 영업이익(34.3%), 순이익(60.9%) 모두 직전 분기 대비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누적 기준 전기·전자, 제약 등 13개 업종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건설, 유통 등 7개 업종은 감소했다.영업이익은 전기·전자, 제약 등 10개 업종은 늘었고 운송·창고, 화학 등 10개 업종은 줄었다. 순이익은 전기·전자, 제약 등 7개 업종 증가, 전기·전자, 제약 등 7개 업종은 감소이다. 연결재무제표 제출 12월 결산 상장법인 709사 중 70사를 제외한 639사도 연결 매출액(5.4%), 영업이익(15.0%), 순이익(25.8%)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영업이익률(0.65%p) 및 순이익률(1.07%p)도 개선됐다.한편 금융업 42사(총47사 중 5사제외)의 영업이익(3.0%)과 순이익(11.3%)은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특히 코스피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증권업종의 실적 개선폭이 컸다. 영업이익 증가 부문은 증권(32.1%), 금융지주(1.9%) 등이며, 순이익은 증권(36.0%), 금융지주(13.7%) 등이다.

![[기고] 금값 급등 시대, 포트폴리오의 10%는 금으로 채워라](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11/18/ecn20251118000089.353x220.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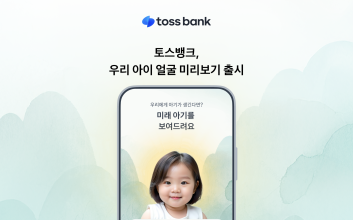




![비트코인, 1억 3천 4백만원대 마감… 4.86% 하락 [AI 시황]](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11/18/ecn20251118000087.353x220.0.jpg)









![딱 1분… 숏폼 드라마계 다크호스 ‘야자캠프’를 아시나요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09/isp20251109000035.400.0.jpg)
![샤넬부터 친환경 재킷까지...지드래곤의 '화려한' 공항패션 [얼마예요]](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11/08/ecn20251108000008.400.0.jpg)


